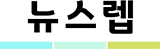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나목처럼
편하게 함께하다 화려하게 치장하고 화장하면
모르던 사람처럼
단청안한 처마도 단청한 처마도 새롭긴 매한가지
나무로 돌로 부처님 모셔놓고 금칠을 안한 부처님
나랑 님이랑 비슷한 느낌에 편안하고
구름에 달빛에 비친 당신 얼굴
화장하지 않아도 이뻐라.
#작가의 변
조계사 국화축제 유감
조계사 경내가 동물원처럼 변했다. 부처님이 국화이불을 덮고 계신다.
나는 꽃을 좋아한다. 하지만 사진을 보는 순간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부처님은 우리의 마음에 살아 계신다. 그런데 나의 마음이 편하지 않다. 부처님도 그러하리라 생각이 된다. 조계사에서 10월과 11월 국화축제, 국화향기 나눔행사를 하고 있다. 물론 캐나다에 사는 나로서는 국화향기를 맡을 수 없다. 하지만 사진만 보아도 왠지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현대 사회는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한다. 가능하다면 치우고 없애는 미니멀 라이프가 공수레공수거 즉,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천주교 신자이던 내가 불교신자 아내를 만나 여러 사찰들을 다녀보게 되고 이민 오기 전에 살던 지역에서 자주 다니던 사찰을 빼고 연애할 때 자주 만나던 곳이 조계사 찻집이었다. 서울에서 흙을 밟아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 중에 한 곳이기도 했다. 시골 촌놈 출신이어서 발아 밟히는 흙 느낌이 좋았다. 한국 대표 불교 사찰이면서도 많이 가꾸지 않아 여백의 미가 살아 있어 좋았다. 도심 속에서 깊은 산사를 느낄 수 있는 느낌이었달까. 아무튼 경내를 나서면 인파로 들끓는 번화가 이어도 경내에서 부처님을 바라보고 찻집에서 않아 향내를 맡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기 전 꾼 꿈이 조그만 옹달샘에 표주박이 동동 떠있는 꿈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면서 반사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어머니는 싫어 하셨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부모님들도 나를 낳고 나서서 일 년에 한 두 번 갈까 말까한 사찰행이었기 때문이었다. 절에 다녀오면 해마다 같은 말들, 물 조심 불 조심하라는 이야기였고 저수지에서 물에 빠져 죽다가 살아 났을 때, ‘그것 봐라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니’라고 말했다. 그래도 초등학교 때 해마다 가는 절 골이나 대각사 사찰 같은 조용한 산사보단 어린 친구들과 같은 또래들이 많은 교회가 좋았다. 음치로 찬송가를 부르면 음치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아이들에게 성경구절을 가르치는 것보단 어린 친구들 얼굴에서 천진난만한 부처님을 본 것 일수도 있다. 거창 장생골 기도원에 전국에서 모인 몇 만 명의 대한예장의 식구들이 산골짜기를 텐트로 가득 메우고 개울에서 목욕을 하던 시절은 평생 기억에 남는 일이었다.
살아오면서 늘 기도할 대상이 필요했다. 하지만 홀로 울부짖는 메아리처럼 돌아오지 않는 응답에 답답해했던 것 같다. 종교마다 다른 기도방식, 다른 기도 시간, 도를 아십니까로 유명한 대순진리회가 불원불식이라고 함께 숙소에서 지내면서 자정에 제사같이 두루마기를 입고 기도를 하고 하루 한 끼만을 같이 먹으면서 포교한다고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대학가를 배회하던 날에도 진리를 향한 궁금증이 궁극의 질문이자 목표였다. 이민 와서도 절엘 가냐고, 이민사회는 교회중심으로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이민 초기 농장의 농가를 사서 농가 2층에 부처님을 모셔 놓고 가족같이 함께 밭일하고 조경일을 하던 그 시절이 어쩌면 이민 생활 중에 가장 행복했었던 시절이었는지 모른다. 취업이민을 왔지만 취업을 못하고 가져온 생활비는 바닥이 난 상태여도 마음은 편안했던 시절이었다.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쌍둥이와 나만 바라보던 아내와 사찰에 가다 길에서 퍼져버린 중고차이자 나의 첫 번째 차였던 토파즈 머큐리 1984형 차량을 큰 길에서 길 가장자리까지 밀어 주던 순수했던 백인들.
흉터를 감추려고 화장을 하고 가난을 감추려고 명품을 들어도 마음에 휑하니 찬바람이 불면 그 모든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 부처님을 국화꽃으로 치장을 하고 공룡을 세워 국화로 치장을 하기 보단 조계사 건물하나에 무료급식을 해서 가난에 찌든 도시 빈민에 깃든 부처님의 본성을 깨우는 것이 화려한 치장하고 국화로 감싼 축제보다 더욱 값진 일이라 생각한다. 걸식하던 부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 걸식하지 않는 한국 불교의 스님들이 자비로 베푸는 급식이야말로 걸식보다 더욱 값진 일이 아닐까싶다. 중생들에게 굳이 채식을 강요할 일도 없지만 채식과 샐러드만 베푸는 급식이라도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불교였으면 한다.
-------------------------------------------------------------------------------------

#전재민(Terry)은
캐나다 BC주 밴쿠버에 살고 있는 ‘셰프’이자, 시인(詩人)이다. 경희대학교에서 전통조리를 공부했다. 1987년 군 전역 후 조리학원을 다니면서 한식과 중식도 경험했다. 캐나다에서는 주로 양식을 조리한다. 법명은 현봉(玄鋒).
전재민은 ‘숨 쉬고 살기 위해 시를 쓴다’고 말한다. ‘나 살자고 한 시 쓰기’이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감하는 이들이 늘고, 감동하는 독자가 있어 ‘타인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음을 깨닫는다’고 말한다. 밥만으로 살 수 없고, 숨 만 쉬고 살 수 없는 게 사람이라고 전재민은 말한다. 그는 시를 어렵게 쓰지 않는다. 사람들과 교감하기 위해서다. 종교인이 직업이지만, 직업인이 되면 안 되듯, 문학을 직업으로 여길 수 없는 시대라는 전 시인은 먹고 살기 위해 시를 쓰지 않는다. 때로는 거미가 거미줄 치듯 시가 쉽게 나오기도 하고, 숨이 막히도록 쓰지 못할 때도 있다. 시가 나오지 않으면 그저 기다린다. 공감하고 소통하는 사회를 꿈꾸며 오늘도 시를 쓴다.
2017년 1월 (사)문학사랑으로 등단했다. 2017년 문학사랑 신인 작품상(아스팔트 위에서 외 4편)과 충청예술 초대작가상을 수상했다. 현재 문학사랑 회원이자 캐나다 한국문인협회 이사, 밴쿠버 중앙일보 명예기자이다. 시집 <밴쿠버 연가>(오늘문학사 2018년 3월)를 냈고, 계간 문학사랑 봄호(2017년)에 시 ‘아는 만큼’ 외 4편을 게재했다.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했다. 밴쿠버 중앙일보에 <전재민의 밴쿠버 사는 이야기>를 연재했고, 밴쿠버 교육신문에 ‘시인이 보는 세상’을 기고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mytrea7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