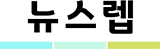보드레한 방금 구운 빵처럼
부드럽기를 원하지만
스스로조차 부드럽지 않다
야들야들한 초록 새순처럼
싱그럽길 바라지만
날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 거친 나뭇등걸 같다
솜틀로 타 온 솜처럼 포근하길 원하지만
삼베보다도 거칠어서
살이 닿으면 베일 것만 같다
달콤한 솜사탕처럼
혓 끝에 감도는 느낌처럼
달콤한 길을 원하지만
날마다 쓰디쓴 커피보다 더 쓴 삶을 마시고
늘 꿈길에서만 부드러워라.
#작가의 변
수천 년을 버텨 온 바위가 쪼개지면 칼날처럼 날카로운 돌들이 된다. 그리고는 바람을 만나고, 물을 만나 산 아래를 구르기도 하고, 개울을 구르고 강물을 구르고 나면 맨질맨질한 돌이 된다. 남한강 강가엔 수석으로 쓸만한 돌들이 많았다. 강원도 태백산 산골짜기에서 발원해서 영월, 단양을 거쳐 제천으로 들어오는 강엔 강원도 감자처럼 동글동글한 돌들이 정말로 많았는데, 그냥 동글동글한 돌들이 아니고 돌에 세상을 그려 넣은 듯한 돌도 있고 동물 형상, 사람 형상을 한 돌들도 있다.
처음 수석을 보았을 땐 신기한 돌이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신기하고 진기한 돌이 돈이 된다고 하니 시골 아이는 눈이 번쩍 뜨였다. 하지만 맘에 드는 수석을 수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묘하게 생긴 돌을 찾아야지 하고 강가를 걸어가다 보면 눈이 빠질 것만 같다.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냥 강가를 걷는 것이라면 마음이 가라앉고 평안해질 수도 있는 길이지만, 마음에 욕심을 내는 순간 그 욕심의 무게만큼 마음이 무거워져 발걸음도 무거워지는 것이다. 캐나다 비씨 주의 칠리왁에도 강가에 돌이 많아 수석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찾는다고 하지만, 왠지 돌들이 크고 수석 같은 돌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사람들은 “나 생긴 대로 살게 내 버려둬”라는 말을 자주 한다. 사회는 돌들처럼 나를 갈아 동글동글하게 서로 부딪혀도 상처를 입지 않게 마음을 갈아 내야 한다. 그럼에도 원석같이 순수한 내가 좋다고 어릴 때부터 하던 행동을 하거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 날카로운 모서리를 간직한 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말이다. 물론 사람은 잘 변하지 않고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성품은 잘 바뀌지 않는다. 학교에서 도덕을 배우고 사회 규범을 배우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남들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지름길도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굳이 힘들게 일해야 할까 하면서 말이다. “세상은 불공평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사회에 대한 불만은 쌓여 가고, 날이 선 나의 마음을 갈아 내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들어 온다. 그리고 세상살이가 강물에 흘러가는 돌처럼 둥글지 않으면 구르지 못하고 남들에 쳐지게 되어 있다.
“세상은 둥글둥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자기 주관이 뚜렷하거나 개성이 뚜렷한 그것은 차라리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살아 있어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란 생각이 들 것이다. 특히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거나 옳고 그름이 명확해야 하는 경우는 특히 더 그렇다. 대부분은 아픔을 느끼면서도 참는다. 날카로운 나를 갈아 내는 아픔은 크다. 유행을 타는 유행 가요나 의상이 아닌데 나를 버리고 고만고만 비슷한 모습을 한다는 것은 별로 좋은 일도 아니다. 나는 교복 세대이다. 일제시대에 입었던 까만 교복을 입고 하얀색의 카라를 목이 닿는 곳에 댄 교복에 한자로 중자 배지를 단 까만 모자를 까까머리나 삼고 머리를 하고 학교를 다녔다. 물론 하복은 하늘색의 반팔 교복과 회색 바지를 입었다. 교복을 입고 다닐 땐 교복을 입었으니 버스에서 자리 양보를 하지 않아도 모자를 안 쓰고 장발을 하고 다녀도 바로 표시가 난다. 귀밑에서 몇 센티라는 규정이 있는 여학생의 단발도 눈에 띄지 않고 보편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맞춤 교복을 맞춰 입거나 당고바지를 입거나, 약간 나팔바지를 입거나, 브랜드 교복을 입어 나를 좀 더 눈에 보이려 노력하던 학생들의 노력은 눈물겹다. 통제된 사회에서는 더욱더 자유로움을 갈망한다. 그것이 티끌보다 작은 아주 하찮은 것일지라도 말이다. 민주 사회에서도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로 인해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거나 소외될 수 있다. 둥글둥글 휩쓸려 가지 않아서 한쪽 구석으로 밀려나게 된다. 커다란 나의 희망과 소원도 사회에서 부딪히고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 보면 점점 작아져서 모래알처럼 작아지기도 하고 아예 없어지기도 한다. 희망이 꿈이 없어진 삶은 삶의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게 한다. 그래서 삶의 동기 부여가 있어야 한다. 모나지 않고 어울리고 살아가 돼 나를 잃지 않는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 세상은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시작은 가정, 가족이 되기도 하고 직장이 되기도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 주기도 하는 협력이 전재가 되어야 모두가 살아가는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다. 사람만 좋자고 자연을 훼손하면 자연은 우리에게 더 아픔을 요구하기도 한다. 달콤한 아이스크림은 당뇨를 불러올 수 있고 부드러움은 사용할수록 부드러움이 없어지고 거칠어진다. 아기의 꼬물꼬물하던 손가락이 거칠어져 두꺼비 등가죽처럼 되어 버린 농부 아버지의 손처럼 되어 가듯이 말이다. 쓴 것을 자주 마시면 인이 배어 쓴 것을 모르듯이 익숙해짐과 새로운 것의 경계에서 우리는 나를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내가 날카로운 말을 상대에게 던지면 상대도 나에게 날카로운 비수 같은 말을 던지거나 진짜 비수를 던지기도 한다. 거울을 보지 못하던 거울이 없던 세상처럼 물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넌 누구니 하고 물을 사정없이 두들기듯이 거울을 보는 요즘에도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다.
-------------------------------------------------------------------------------------

#전재민(Terry)은
캐나다 BC주 밴쿠버에 사는 ‘셰프’이자, 시인(詩人)이다. 경희대학교에서 전통 조리를 공부했다. 1987년 군 전역 후 조리 학원에 다니며 한식과 중식도 경험했다. 캐나다에서는 주로 양식을 조리한다. 법명은 현봉(玄鋒).
전재민은 ‘숨 쉬고 살기 위해 시를 쓴다’고 말한다. ‘나 살자고 한 시 쓰기’이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감하는 이들이 늘고, 감동하는 독자가 있어 ‘타인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음을 깨닫는다’고 말한다. 밥만으로 살 수 없고, 숨만 쉬고 살 수 없는 게 사람이라고 전재민은 말한다. 그는 시를 어렵게 쓰지 않는다. 사람들과 교감하기 위해서다. 종교인이 직업이지만, 직업인이 되면 안 되듯, 문학을 직업으로 여길 수 없는 시대라는 전 시인은 먹고살기 위해 시를 쓰지 않는다. 때로는 거미가 거미줄 치듯 시가 쉽게 나오기도 하고, 숨이 막히도록 쓰지 못할 때도 있다. 시가 나오지 않으면 그저 기다린다. 공감하고 소통하는 사회를 꿈꾸며 오늘도 시를 쓴다.
2017년 1월 (사)문학사랑으로 등단했다. 2017년 문학사랑 신인 작품상(아스팔트 위에서 외 4편)과 충청예술 초대작가상을 수상했다. 현재 문학사랑 회원이자 캐나다 한국문인협회 이사, 밴쿠버 중앙일보 명예기자이다. 시집 <밴쿠버 연가>(오늘문학사 2018년 3월)를 냈고, 계간 문학사랑 봄호(2017년)에 시 ‘아는 만큼’ 외 4편을 게재했다.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했다. 밴쿠버 중앙일보에 <전재민의 밴쿠버 사는 이야기>를 연재했고, 밴쿠버 교육신문에 ‘시인이 보는 세상’을 기고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mytrea7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