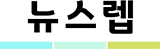바위가 굴러올 땐
피해야 살아
태풍이 불어오면
피해야 살지
고요한 숲속
햇빛 못 봐 크지 못하는 가녀리고 작은 나무
죽어 말라서도 눕지 못하는 나무
죽은 고목에 새싹을 피우는 새싹 나무도 있지
나무는 평생 한자리에서 살아
바람 부는 날이나
눈 오는 날에도
숲속 나무처럼
바위가 굴러올 땐
피해야 살아
태풍이 불어오면
피해야 살지
고요한 숲속
햇빛 못 봐 크지 못하는 가녀리고
고국 떠나 뿌리 없는 나무처럼 떠도는 이민자는
칼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바람 소리에게 소식 전하고 눈물 훔치며.

#작가의 변
도토리를 주식으로 하는 다람쥐는 도토리를 땅을 파고 저장해 둔다. 도토리가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지지만 눈 쌓이거나 눈이 쌓이지 않더라도 공원 청소하는 공원 관리원이 도토리를 청소기로 싹 쓸어 간다. 나무에서 긴 꼬리를 곧추세우고 땅으로 내려온 다람쥐가 껑충 껑충 점프하면서 걷는데 그 걸음이 흡사 묘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인다. 꼬리가 몸통만 한데 그 꼬리에 힘을 잔뜩 주고도 유연하게 껑충껑충 걷는 것인지 뛰는 것인지 구분하기 힘들다. 다람쥐가 땅을 파고 묻어 둔 도토리를 다 기억하지 못하고 다람쥐가 먹지 않은 도토리는 싹을 틔워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킨다.
그 도토리의 일부를 주워다 도토리묵을 쑤는 사람들이 이민자인 한국 사람들이다. 도토리를 주우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뭘 하느냐고 묻는 경우가 많다. 사실 공원 내에서 채취나 고사리 꺾기 등을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지천으로 널린 아니 발에 밟히는 도토리를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 도토리를 주워다 찰랑찰랑한 도토리묵을 먹을 생각에 도토리를 주워다 손이 새까맣게 변할 때까지 물에 담가 두었던 도토리를 까서 떫은 걸 뺀다고 물에 담갔다가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도토리묵을 쑤면 도토리묵으로 엉기지 않고 풀처럼 힘이 하나도 없는 결과가 나온다. 그것이 아까워 밀가루를 섞어 전을 부쳐 먹으면 그리 맛있을 수가 없다. 우리만 그랬던 건 아니고 아는 지인의 어머니도 생전에 도토리 줍는 것을 낙으로 삼으셨다고 한다. 도토리 가루를 만들어 자녀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기 위한 마음과 시간을 소일하기 위함이다.
뇌경색 증상으로 혼자서 걷는 것이 불안하고 자꾸만 삐뚤빼뚤 걷고 쓰러질 듯하니까 아내가 옆에서 부축해서 병원 주변을 걷다가 “자기야 나 힘들어. 저기 앉아서 쉬었다 가자.” 공원 벤치에 새 발자국이 어지러이 나 있어서 아내가 닦으면서 “기다려봐 여기에 앉아.” 한다. 벤치에 앉아서 운동장의 축구를 하는 청소년들을 보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열심히 주워 먹고 있는 캐나다 구스를 보면서 “쟤들은 몸무게가 꽤 나갈 것 같은데 잘만 날으더라.”, “비행기는 수 백 명을 태우고 날기도 하지만.”라고 했더니 아내 왈 “ 비행기는 날개짓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스를 태워서 가잖아.” 한다.
아프니까 밖을 자주 나가지 못하지만 나가면 자세히 보게 된다. 그냥 흘려 버리던 것들도 새로워 보인다.
지금은 내가 먹고 싶고 먹으려고 맘을 먹으면 대부분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내가 사는 곳이 캐나다 밴쿠버라서 웬만한 한국 음식이나 중국 음식, 태국 음식, 인도 음식 등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사서 먹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음식에 대한 허기를 채우지 못해 늘 불만이다. 양식은 이민 사회에서 자주 접하는 것이고 특히 맥도날드 음식이나 서브웨이 등은 쉬워서 자주 가게 되는 페스트 푸드점 이기도 하다.
내가 어릴 때, 즉 소위 나 때는 커다란 밥그릇에 밥을 고봉으로 수북이 퍼 담은 밥상에 반찬이라고 해봐야 찌개나 아니면 국, 그리고 나물이 있을 때도 있고 시어 터진 김치만 올라 올 때가 많았다. 김치를 썰어 놓기도 하지만 포기 째 그냥 놓고 손으로 쭉 찢어서 밥 위에 놓아 주는 것을 받아먹는 재미가 좋았다. 시장에 열무 팔러 가고 나물 팔러 함지를 이고 시내로 갔다 온 어머니가 돌아오면서 무엇인가 사서 오길 바랐다. 나중에 엄마와 배추 팔러 시장에 가서 추운데 덜덜 떨다가 언덕배기 집까지 배달을 해주고 집에 돌아오면서 무엇인가 사서 오는 것도 쉽지 않음을 느꼈지만 말이다. 군것질이라 봐야 고구마를 삶아 먹거나 대추나 밤 같은 것을 먹는 정도였지만 지금도 그리운 것은 열무 팔고 오면서 사 온 찐빵 맛과 군에서 친구들이 집에 몰려왔을 때 어머니가 끓여 준 옥수수와 수수, 팥 등 여러 가지 잡곡이 들어간 옥수수 잡곡 죽이다. 지금은 음식의 풍요 속의 빈곤이고, 자랄 땐 어머니 손이 닿지 않으면 먹지 못하던 시절이어서 시장에 가서 아이스바 플라스틱을 엮어 만든 발을 지나서 들어간 중국집에 짜장면만큼 맛있는 음식을 찾기 힘들다.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해 본 지인이 “다 다녀 봤지만 캐나다가 최고”라고 했다. 다녀 보니 아는 것과 보지 못하고 상상하는 것이나 영상으로 보는 것은 직접 체험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나무는 평생을 한자리에서 살아가는데 답답하지 않을까 싶다 가도 일 년에 한 번씩 죽고 사는 풀들을 보면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소중할 뿐이다. 하루살이에겐 하루가 얼마나 길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루살이의 평생은 사람의 하루일 뿐인데.
-------------------------------------------------------------------------------------

#전재민(Terry)은
캐나다 BC주 밴쿠버에 사는 ‘셰프’이자, 시인(詩人)이다. 경희대학교에서 전통 조리를 공부했다. 1987년 군 전역 후 조리 학원에 다니며 한식과 중식도 경험했다. 캐나다에서는 주로 양식을 조리한다. 법명은 현봉(玄鋒).
전재민은 ‘숨 쉬고 살기 위해 시를 쓴다’고 말한다. ‘나 살자고 한 시 쓰기’이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감하는 이들이 늘고, 감동하는 독자가 있어 ‘타인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음을 깨닫는다’고 말한다. 밥만으로 살 수 없고, 숨만 쉬고 살 수 없는 게 사람이라고 전재민은 말한다. 그는 시를 어렵게 쓰지 않는다. 사람들과 교감하기 위해서다. 종교인이 직업이지만, 직업인이 되면 안 되듯, 문학을 직업으로 여길 수 없는 시대라는 전 시인은 먹고살기 위해 시를 쓰지 않는다. 때로는 거미가 거미줄 치듯 시가 쉽게 나오기도 하고, 숨이 막히도록 쓰지 못할 때도 있다. 시가 나오지 않으면 그저 기다린다. 공감하고 소통하는 사회를 꿈꾸며 오늘도 시를 쓴다.
2017년 1월 (사)문학사랑으로 등단했다. 2017년 문학사랑 신인 작품상(아스팔트 위에서 외 4편)과 충청예술 초대작가상을 수상했다. 현재 문학사랑 회원이자 캐나다 한국문인협회 이사, 밴쿠버 중앙일보 명예기자이다. 시집 <밴쿠버 연가>(오늘문학사 2018년 3월)를 냈고, 계간 문학사랑 봄호(2017년)에 시 ‘아는 만큼’ 외 4편을 게재했다.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했다. 밴쿠버 중앙일보에 <전재민의 밴쿠버 사는 이야기>를 연재했고, 밴쿠버 교육신문에 ‘시인이 보는 세상’을 기고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mytrea7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