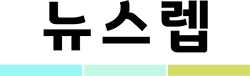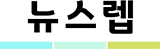조계종립 동국대 교정의 불상은 사천왕상이 사방을 외호하는 새로운 조형 감각으로 불교미술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불상 옆에 '동국대총학생회 발원건립'이라고 쓰인 동판만 남긴 이 불상의 뒷 이야기를 담은 책이 출간됐다.
손연칠 선생과 그의 아들 손문일 선생이 함께 쓴 <불교미술의 시대정신>이다. 저자 손연칠 선생은 동국대 미술학과 1기생이다. 송광사 대웅전, 불국사 무설전, 해인사 미타원, 동국대 만불전 등에 불상화 불화를 봉안했다. 법전 녹원 지관 통광 스님 등 진영뿐 아니라 의상대사상 선덕여왕상 허난설헌상 등 표준 영정을 만든 원로 작가이다.
동국대 불상은 동국대 제2·5·6대 총장을 지낸 백성욱 박사(1897~1981)가 1964년 제5대 총장에 재임하면서 조성했다. 동상은 김영중 선생(1926~2005)이 만들었다.
앞선 1953년, 동국대에 장학재단을 최초 설립한 손석재(1882~1960) 여사의 동상이 세워졌다. 이 동상 역시 김영중 선생 작품이었다. 손 여사의 동생은 4.19를 거치면서 훼손돼 창고에 보관 중이었다. 백성욱 총장은 창고에 있던 손 여사의 동상을 김영중 선생을 통해 지금의 동국대 불상으로 만들었다.

손연칠 선생은 26일 인사동에서 출판기념간담회를 열고는 "동국대 불상을 조성했을 당시 김영중 선생이 38세였다. 젊은 김영중 선생은 과감한 시도를 하려고 했다. 그는 역동적인 불상을 만들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선생은 앞으로 걸어나가려는 불상을 만들려고 했지만 스님 등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당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전국의 불사를 시대적 감각과 거리가 있는 전통 화승들 손으로 이어지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동국대 불상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자세히 봐야만 알 수 있는 한쪽 어깨가 살짝 기울고 한쪽 무릎이 들린 지금의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김영중 선생은 한국미술진흥법(1969), 미술관법(1989), 미술장식품법(1997), 한국미술저작권법 등 우리나라 미술정책과 제도를 마련한 주인공이다. 광주비엔날레 창설 주역으로 목포유달상조각공원(1982), 제주조각공원(1986), 88올림픽준공기념탑, 독립기념관 불굴의 한국인상, 세종문화회관 벽면의 비천상 등이 그의 작품이다.


저자는 책의 곳곳에 한국 불교미술이 전통 답습에 그친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몰개성적인 불사를 변혁하지 않고서는 신세대 포교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시대정신에 맞는 불교미술을 통해 불교의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우리는 자랑스런 불교미술의 창의적 전통을 갖고 있으면서도 일본이나 이웃종교인 한국교회 미술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이어서 "그들은 일찍부터 시대정신에 따른 창조적인 미술 운동을 한다. 불교미술 역시 시대 정신에 따라 독자적인 창의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 역사상 문화의 꽃이 가장 활짝 피었던 통일신라시대 석굴암이나 반가사유상, 성덕대왕신종 등을 언급한다.
저자는 "과거의 우리 민족의 우월성 같은 영예로움을 되찾는 길은 불가능 한가의 의문에서 시작해 현대화단에서 서양사고 중심의 미술 생태계가 한국화 위축을 가속시키고 있음에 대한 현실적 자책감이 이 책 집필의 원동력이 됐다"고 말한다.
불교의 시대정신┃손연칠·손문일 지음┃푸쉬킨하우스┃2만5000원